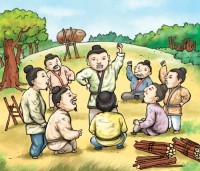 길 옆에 있는 바위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길 옆에 있는 바위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양주시 장흥면 일영에 ‘구만리’라는 곳이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거북이 모양의 큰 바위가 연못 근처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살갑던 옛 마을의 정취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실시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채록 작업에서 주민 윤순종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일영리 어느 경로당 앞에 있는 공장이 옛날 거북바위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거북이가 양쪽 발을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내딛으면서 주둥이를 내밀고 있는 모양이어서 마을 이름을 거북 구(龜)와 가득할 만(滿)을 써서 구만리라고 했다.
그런데 한 때는 궁을 나온 내시들이 와서 그 곳에 집을 짓고 살더니, 최근에는 서울 사람들이 일대를 모두 깎고 파내고 묻어서 마을 형색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 때 거북바위도 없어지고 연못도 메꿔지고 만 것이다.
구만리 거북바위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여름이면 바위에 올라가서 놀 정도로 컸고, 피서를 할 정도로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해마다 봄이면 마을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연못물을 빼서 깨끗하게 한 뒤 붕어를 잡아넣으며 관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풍수학적으로 명당자리라고 해서 개인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그 때만해도 그 일대가 아주 부촌이었으니, 십장생의 하나인 거북이가 가진 복과 명이 마을을 지킨다고 생각했음직 하다.
하지만 풍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현대에 와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위를 깨뜨리고 건물을 지었다. 부촌이었다던 구만리의 자긍심이자 상징이었던 거북바위는 사라졌고, 흔한 시골마을의 모습이 되어 이름으로만 겨우 남아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곳을 없애버린 안타까운 사연은 은현면 봉암리에도 있다. 주민 남선휘씨가 전해준 이야기인데, 마을 개울가에 벼락바위라고도 부르는 용바위가 있다고 한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벼락을 쳐서 바위에 남긴 흔적이 지금도 있는데, 바로 옆 개울에 그 이무기가 살던 굴이 있었다고 한다. ‘석배’라고 했던 굴은 상당히 깊었다고 하는데, 현재 완전히 훼손되어 없어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하늘의 다섯 구문인 오관 중에서 북관을 다스리는 현무(거북), 개천에서 용 난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용바위와 석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양주 지역문화의 특징을 살려줄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